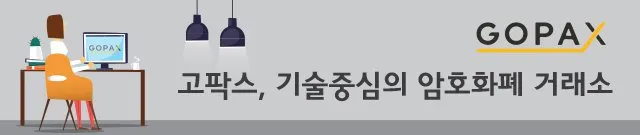사소한 단편적 기억임에도 유난히 선명한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놀다가 같은 반 여자애가 뾰로통한 표정으로 하지만 적당한 애교를 담아 볼멘소리를 건넨다.
박송이(가명)라고 부르지 마! 안 친한 사람 같잖아. '송이야'라고 불러줘.
금방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놀이는 계속되었지만 자못 상처를 받은 게 분명했던 그 아이의 표정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맺혔다. 그 순간부터 이름을 부르고 불린다는 행위에 마음이 담기는 거구나 생각했다.
어릴 때는 너무도 흔한 내 이름이 싫었다. 김혜진, 하필 성도 김 씨다. 세상에서 제일 흔한 이름. 새 학기가 될 때마다 한 두 명이 아닌 동명이인들. 혜진이들. 혜진이들은 숙명적으로 별명을 붙여줘야 했다. 작은 혜진이, 덜 검은 혜진이, 안경 낀 혜진이. 이름이라는 건 개인을 특정하기 위해 붙인 건데 이렇게 공공재와 다를 바 없어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아빠는 딸의 이름을 손수 짓기 위해 고심하며 옥편을 뒤적였다. 지혜'혜'에 보배'진'. 그나마 은혜 '혜'가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획순도 꾹꾹 눌러가며 이름을 썼다. 어느 날은 아빠에게 시위하듯이 물었다.
-아빠. 도대체 왜 이렇게 흔한 이름을 지어준 거야?
-얼마나 예쁜 이름이니. 그 시절엔 아무도 없었어.
그랬다. 애석하게도 그 당시 그리 흔하지 않았던 '혜진'이란 이름은 사람들이 단체로 외계 생명체와 교신이라도 성공해서 텔레파시가 통한 건지, 안 사고 못 배기는 인기 상품의 유혹에 걸렸는지 갑자기 한 번에 딸아이 이름으로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간택당한 게 분명하다. 나는 흔해빠진 내 이름에 그다지 애정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름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몇 번이고 되뇐다. 대학시절 OT자리에서 제비뽑기로 뽑았던 '동기 이름 외우기' 미션도 성공했다. 나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걸 참 좋아한다. 너라는 대명사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 부르는 걸 선호하다.
한 번은 베프랑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을 잊어보고 싶다며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신분 밝히지 않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해서 신분 위장하기를 해보고 싶단 말이 나왔다. 물론 5분도 안되어 그 우스꽝스러운 계획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말 끝마다 베프의 이름을 불렀다.
M은 그런 거 잘하잖아. M이 좋아하면 좋겠어. M은 어디 가고 싶은데? 등등
물론 여행 중에도 나는 한 문장에 한 번씩은 베프 이름을 불렀다. 그냥 '맛있어?'라는 질문도 꼭 이름을 넣어 ' OO 맛있어?라고 물었다.
애칭 같은 거 보단 역시 이름이 좋다. 남자 친구를 장난스럽게 지칭할 때야 '집요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다.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이름으로 부르길 좋아한다. 오빠고 자기고 남편이고 그래도 역시 이름이 좋다. 헌터헌터라는 만화책에서 곤이 자신의 아빠를 '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좀 부럽다. 새언니도 이름을 넣어서 부르고 싶다. 새언니도 그냥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번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살면서 내 이름 또한 많이 불리게 되었다. 다 같은 이름은 아니었다. 그저 출석체크를 확인하기 위한 단조로운 '김혜진,' 적당한 예의와 거리감을 담은 '혜진씨,' 친한 아이들이 불러주던 끝을 길게 잡아 끄는 애정이 담긴 '혜지~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또 놀리려고 날 부르던 오빠의 음성 '기메~진', 노래하듯이 다정했던 숨소리로 시작하던 음성의 '혜진이~' 그리고 낯선 음성을 어떻게든 따라 해 보는 애쓰는 음성의 '하이진'
날 부르는 누군가의 음성과 높낮이에 나에 대한 마음이 담겨있고 우리 관계가 담겨있다. 관계의 변주에 따라 내 이름은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짧고 굵게 끊어질 때도 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담긴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른 이가 아닌 딱 하나의 그가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 이름은 스위치를 켜듯 지금부터 내 앞에 존재할 당신을 기억하겠다는 신호, 당신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고백과 같다. 그날의 기분, 감정과는 별개로 이름을 부를 땐 나도 모르게 늘 일정해진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깐. 그래서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 유독 쓸쓸하고 우울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나직이 이름을 불러준 후 그저 손 한 번을 잡아준 채 아무 말도 못 하는 건지도 모른다.
당신이 그 자체로 있어주는 소중함에 대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의, 이름 부르기.
지금은 무난하고 예쁘게 불리는 그리고 익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는 흔해 빠진 내 이름이 좋다. 이름은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불러지면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만들어간다. 그들이 불러준 수많은 이름은 내 기억에 쌓여 별명이 없이도 나를 완성해간다. 내 이름을 부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그런 한 명의 누군가의 '혜진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그러니 내 이름을 불러줘요.
P.S. 스팀잇에서는 고물이라고 불리는 게 참 좋습니다.
[안녕, 감정] 시리즈
01 입장 정리
02 감정을 드러내는 거리
03 평화의 날
04 다름에서 피어나는 감정
05 아플 때 드는 감정
06 열등감 - part 1
07 나의 무기력
08 열등감 - part 2
09 거짓 감정
10 위로에 드는 감정
11 인정 그리고 책임
12 멀어지는 교차로에 선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