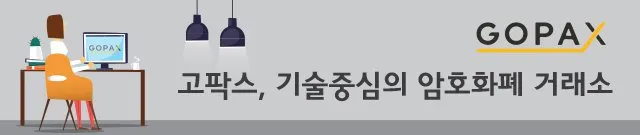어제 저녁 비가 왔다. 흠뻑 젖을 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동차 전조등 사이를 비스듬한 선으로 채울 만큼 충분한 비가 내렸다. 준비 없이 비를 만나 서서히 비에 젖어가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초록빛 같은 사람이다. 조용하고 말이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단단하고 강하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동시에 언제나 활기 넘쳤다. 그녀와 있으면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다. 배가 찢어져라 거리에서 깔깔거리고 웃다가도 밤거리의 별을 바라보며 삶의 철학을 나누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내가 봤던 어느 누구보다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무슨 계절을 좋아하냐는 가벼운 질문에 쉬이 대답을 하지 못하던 그녀는 내내 고민하다. 고를 수 없다고 말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이라서 가을은 가을이고 겨울은 겨울이기에 모든 사계절이 좋다고 했다. 맑은 날 해가 비치면 해에게 감사했고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으며 좋아했고 바람이 불고 추운 날에는 그 차가운 손에 끼인 장갑을 내밀며 찬바람이 부는 것도 좋다고 했다.
우산이 없고 비에 옷이 젖고 기상청과 날씨 앱이 원망스러워지며 불만이 튀어나올 때쯤 그녀의 은근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비가 와서 좋다. 이렇게 비를 맞아서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생각나니깐.
그녀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3년이 넘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싸움도 사건도 갈등도 없었다. 연인이 아닌 모든 관계는 여전히 이어져있거나 별다른 계기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시간이 지나서 서로의 취향과 처지가 변해서 바빠져서 그것도 아니면 그냥, 왜 있잖아. 어쩌다 보니. 어느 날 일상을 공유하고 정성을 들여 만나던 관계는 문득 뒤돌아보니 멀어져 있었고 어느덧 나의 지인이라 부를 수 없는 거리에 그 사람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씁쓸했다. 그러나 자책이나 원망은 없다.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고 그저 무지했을 따름이고 다행히도 관계란 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 오히려 이럴 땐 편하다. 인연이 거기까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보통 그 감정과 깨달음은 시간이 다 지나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자각된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 교차로에 서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친구가 많지 않다. 인연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특별하다. 나는 그들 모두를 그들 자체로 사랑하고 그들의 애정에 조금의 의심 또한 없다. 우리의 관계는 공고하고 믿음으로 차있다. 좁지만 깊고 단단하다. 이미 여러 차례 정리된 관계 더 이상의 뺄셈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오늘 5개월 만의 D를 만났다. 불편했던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D를 어제 만난 듯 편안했다. 그전부터 이질감을 느낀 적은 있었지만 확실히 오늘 위기감을 느꼈다. 취업에 대한 고민도 곧 결혼을 앞둔 처지도 참 비슷하게 많은 우린데 여전히 그녀와 팔짱을 끼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붙잡는 게 좋은데...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고 침묵하는 시간이 늘었다. 더 별로인 건 그 침묵의 시간 우리는 내내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나는 계속 어색한 웃음이 나오고 D는 무슨 말이든 이어가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여전히 예의 있었고 배려도 있었다. 그러나 D는 그저 D의 말을 했고 나는 나의 말을 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을 했지만 진정 대화를 한 건 아니었다.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가닿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었고 우리 사이를 끈끈히 이어주던 연결고리는 단절되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추억을 간직하는 지인이 되어가는 거다. 만나야 할 이유는 사라지고 어느덧 그 추억은 현실보다 힘이 강해진다. 그저 추억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되는 거다. 그러면 나는 D 역시 자연스럽게 멀어진 하나의 인연으로 생각하겠지. 웃음을 지으며 과거로 넘겨버리는 다시 읽지 않을 책장에 꽂힌 두꺼운 양장본처럼. 그건 하나의 위로는 되지만 나는 절대 그 책을 다시 펼쳐보지 못할 거다.
2시간 반의 만남 이후 우리는 조심히 들어가라 인사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몇 번 만날 테지만 서로 사는 곳이 멀어지는 만큼 점점 멀어질 거란 예감을 했다. 6개월은 1년이 되고 2년을 못 만나도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과 불편함은 사라진다..
그런데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막을 수가 없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우린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다. 애써 노력할 수도 지금의 이 생각과 감정을 D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아무리 D를 보려고 해도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소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잃고 싶은 것도 아닌데 여전히 D를 사랑하지만 멀어지는 것 외엔 달리 도리가 없다. 또다시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는 것이다.
그 자연스러운 멀어짐 앞에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사이의 얼마나 특별한 일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아꼈는 지 같은 건 중요치 않다. 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의 대사처럼 '추억은 힘이 없다.'
시점이 분명하고 의식적인 선택인 연인과의 이별보다 흐릿한 이 자연스러운 멀어짐은 복잡하지 않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더욱 서글프다.
[안녕, 감정] 시리즈
01 입장 정리
02 감정을 드러내는 거리
03 평화의 날
04 다름에서 피어나는 감정
05 아플 때 드는 감정
06 열등감 - part 1
07 나의 무기력
08 열등감 - part 2
09 거짓 감정
10 위로에 드는 감정
11 인정 그리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