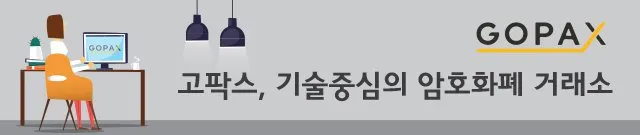글이 쓰고 싶어지는 감정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날은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글이 잘 써지는 감정 상태가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를 되새겨 보자면 감정의 동요가 있고 난 후 살짝 가라앉은 직후 가장 글이 쓰고 싶다.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을 인지하고 조금 가라앉은 시점이 가장 글을 잘 써지고 그다음으로는 기념할 만큼 신나고 기쁜 일이 있었던 직후가 아닐까 싶다. 일상의 반복, 흐트러짐 없는 균형 상태에서는 별로 무언가를 써 내려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결핍되고 불만족스러울 그 시점이 되어서야 나는 글을 찾게 되었던 것 같다.
하려고 하면 사라지는 법칙
감정이라는 주제를 정할 때쯤, 분명 별일 없이도 날마다 감정 증폭을 견디지 못해 힘들었다. 이렇게 요동치는 감정을 다른 이에게 가감 없이 공개해도 좋을까 걱정될 정도였건만, 신기하게도 2월 1일을 기점으로 나는 평소와 달리 무척 평온해졌다. '좋아. 마음껏 널뛰어 봐! 이번 기회에 내가 널 낱낱이 파헤쳐주마!' 마치 감시자가 된 듯 눈에 불을 켜고 판을 깔아놓으니 내 감정의 동요는 자취를 감췄다.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할 땐 없다더니. 하지만 불평할 순 없다. 아니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거야말로 내가 항상 원하는 감정 상태와 기분이 아니었던가. 그래, 변덕스러운 나도 며칠쯤은 평화로울 수 있지.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지켜보는 것도 나의 관전 포인트다. 되도록 오래오래 지속하였으면 좋겠다. (이 시리즈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건 아쉽지만,)
설 연휴에 찾은 평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드는 생각. 이상하게도 매일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열이 받고 스트레스로 자신을 괴롭히다가 만나는 종착지. 결국엔 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비난하고 이런 일을 넘기지 못하고 일일이 감정을 담아두는 나를 탓하며 이내 우울해진다.
' 알고 보면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불만 불평이 넘치는 사람이라 자극 없이도 나란 인간은 항상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쯤 설날이 찾아왔다. 무려 5일간의 휴식 기간. 그래 봤자 휴일에도 방해를 받을 거라고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의심이 떠오른다. 그런데 마침 차장님이 서류 당번을 바꿔달라 했다. 덕분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쉬기로 했다.
단 한 번도 명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님 댁(과거 할머니 댁)에 내려가지 않은 적이 없다. 항상 명절이 지나면 며느리도 아닌 '딸'인 주제에도 늘 기분이 좋지 않았고 명절 증후군에 시달렸다. 명절이 끔찍하게 싫었다. 명절날 오라고 하는 부모님도 싫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안 가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보기로 했다. 엄마에게 '내려가지 않을게.'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역시 엄마는 서운해하셨다.
기분이 나빠지려던 찰나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의 지지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야. 원하는 게 있으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당연하시다. 욕먹으면서 안 가길 선택했으니 맘 편히 욕을 먹자!'
결과적으로 부모님께 미안한 일이지만 생애 처음 평화롭고 멋진 명절을 보냈다. 토요일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람이 무척 많은 쇼핑센터에 끌려갔는데 하품을 내내 하는 게 미안했지만, 맘에 드는 스웨터를 샀다. 일요일에는 6개월 만에 스페인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동생들을 만났다. 자취방에 놀러 갔는데 고양이도 보고 타코도 먹고 차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즐겁게 지냈다. 월요일에는 뜻밖에 고궁을 갔다. 창경궁과 창덕궁을 가로질러 꽤 많이 걸었다. 사람이 얼마 없는 덕분에 더 운치 있고 평화로웠다. 추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햇빛이 비쳐 괜찮았다. 고궁을 거닌 후 마신 디카페인 커피와 대화도 즐거웠다. 저녁에는 글을 쓰고 그다음 날엔 책을 읽었다. 늦잠도 푹 잤고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와 예능프로도 봤다. 그리고 마지막 연휴에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다.
그러고 보니 일을 안 한 덕분인지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했다. 자극이 없으면 구태여 나를 괴롭히진 않는구나. 괴로워지고 싶어서 괴로운 건 아녔다. 다행이다. 역시 내가 완전 똘아이는 아닌가 봐.
평화의 날을 기록하자!
너무 안정적이어서 글이 써지지 않는다는 나의 말을 듣고 친구는 반대라고 했다. 너무 감정적이면 글을 쓰기 힘들다고. 그래서 나도 평소의 습관과는 다르게 평화로운 날을 기록하고 싶어졌다. 자주 잊으니 적어보자! 평화를 대하는 나에 대한 관찰.
걸어갈 땐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피부로 와 닿는 바람이 느껴진다. 시계를 자주 보지 않는다. 길가의 꽃과 못 보던 가게를 발견한다. '어? 이런 게 있었잖아?' 긴장하다가도 숨소리를 듣는다. 곧 마음이 평온해진다.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한 마디 한 마디가 지혜롭게 느껴진다. 미래에 대한 큰 걱정이 없다. 귀찮은 일이 생겨도 그냥 일로서 바라보게 된다. 쓸데없이 소설을 쓰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지금의 문제로만 받아들인다. 어쩔 수 없는 건 포기한다.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일과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냥 그 사람의 일이니 신경 쓰지 않는다. 밝게 인사한다. 귀로 들리는 음악 소리가 더없이 좋다. 적당히 먹고도 만족스럽다. 화를 내는 것처럼 위장에 음식을 들이붓지 않는다. 차의 향이 느껴지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부드럽고 따뜻한 차의 촉감이 좋다. 그리고 지금은 발바닥 아래 느껴지는 난로의 온기가 따땃하니 참 좋다. 이러한 일상이 좋다.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내가 좋다. 마음속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뭔가 열려있고 사랑이 차 있다. 좋다.
가끔 평화의 날을 곱씹어보길 바라며, 이 글을 다음번에 읽으며 내가 미소 짓기를 바라며 평화의 날에 씀.
[안녕, 감정] 시리즈
01 입장 정리
02 감정을 드러내는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