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온 트레일스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산과 산을 가로지르는 길이 그려진 표지도 마음에 들었고, 아마존 선정 올해의 논픽션 도서라는 문구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그래서 목차를 읽어보았는데, 맛, 냄새, 동물, 역사, 트레일이라는 단어가 보였다. 맛있는 음식과 와인, 고양이, 트래킹을 포함한 여행을 좋아하는 나에게 딱 맞는 주제였고, 이 책을 통해 나의 여행기도 조금은 세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혹시 나와 같은 생각으로 이 책을 선택할 사람을 위해 미리 알려두자면, 맛, 냄새는 음식이 아닌 곤충의 페로몬에 대한 이야기, 동물은 코끼리, 버팔로와 같은 야생동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책은 저자가 다섯 달간 미국 동부의 애팔래치안 트레일을 종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3박 4일의 트레킹이 이제껏 경험했던 트레킹의 전부인 나로서는 대체 무슨 짐을 어떻게 들고 걸으면 다섯 달 동안 걸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었다. 그것은 곧이어 등장한 저자의 상세한 설명 덕분에 해소되었는데, 그는 대부분 짐을 초경량 제품으로 바꿨을 뿐 아니라, 걷는 동안 먹을 음식을 날짜에 맞춰 애팔래치안 산맥 군데군데 있는 도시의 우체국에 보냈고, 종주 중에 히치하이킹을 통해 도시를 들러 그 음식을 가지고 다시 트레일로 향했다.
저자가 묘사하는 애팔래치안 산맥의 경관을 감상하며 다음의 목적지로 이곳을 선택할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나는 히치하이킹이라는 단어에 모든 마음을 접었다. 모험은 좋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차를 불쑥 얻어 타는 것은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어릴 적 해외에서 한 번 시도했던 히치하이킹으로, 얼마 없는 돈을 모두 뜯길 뻔한 경험도 있었다. 때문에 저자가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역시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나만은 아닌가 보다.
위 글을 통해 저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느껴졌는데, 저자의 <감사의 말>을 통해 운전자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도로변에서 웬 이상한 젊은이를 차에 태워주고 그다음 트레일 입구까지 데려다준 용감한 운전자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고 보면 나 또한 히치 하이커들을 믿지 못해 한 번도 태워준 적이 없었다. 아무래도 애팔래치안 트레일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남기는 여행기는 가능한 한 사진과 함께 한다. 사진을 통해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고, 보았던 광경을 따로 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장점이지만, 사실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오랫동안, 특히 트레킹을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이 책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볼 수 없지만, 사진 없이도 저자의 상세한 묘사에 그 광경을 나름대로 상상해 볼 여지가 생겨 다음에 어디론가 트레킹을 하러 가게 되면 나도 카메라 없이 일기장과 펜만 가지고 훌쩍 떠나볼까 싶기도 하다.
저자는 트레일을 걷고 또 걷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트레킹을 하다 보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굽이굽이 진 트레일을 만들어 놓은 곳이 곳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트레일을 무시하고 나름의 지름길을 만들며,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새롭고 편리한 지름길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 그 발단이었다. 저자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트레일의 역사에 흥미가 생겨, 결국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트레일인 고대 에디아카라기 생물의 화석을 찾아가기도 하고, 나름의 길을 만들어 다니는 곤충과 벌레를 연구한 1700년대 일화들도 소개한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현재 미국의 많은 도로와 버팔로, 너구리 등 야생동물과의 관계였다. 또한 걷는 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삶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 조금 덜 방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애팔레치안 트레일의 역사도 소개한다. 미국에 정착한 초기의 유럽인들은 자연 그대로인 것을 미개한 것으로 여겼기에 나무를 베고 땅을 개간하고 자신의 영토를 가지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후 그로 인해 도시화가 가속되고 자연이 훼손되자 산을 사유지로 사들여 환경을 보존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환경 운동이 일어났으며, 또한 도시에서의 고단한 삶에 지쳐 산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한다. 애팔레치안 트레일은 처음에는 미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어느새 산맥을 따라 캐나다까지 잇는 국제 애팔레치안 트레일이 되었다. 또한 현재는 판게아에서 떨어져 나간 타 대륙에도 애팔래치안의 줄기가 있다는 이유로 유럽을 거쳐 모로코까지 그 트레일로 영입시켰고, 이 책에서는 그 과정 또한 소개한다. 과연 그 모든 트레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얼마 전 뉴질랜드 트레킹 여행기를 쓰면서 신선한 바람과 꽃내음을 맡으며 걸었던 그때가 그리워졌다. 하지만 사람은 추억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면 나도 그곳을 걷는 동안 탈출한 후 먹을 음식에 대해 상상하고, 힘든 길에 짜증 내고, 점점 아파지는 발바닥에 힘들어했으며, 처음에는 인터넷은 물론 전화도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즐겼으나 며칠이 지나자 아무것도 읽을 것이 없는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또한 아무리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을 걷더라도, 내 눈은 대부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땅 만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가 그리운 것은 아마도 그 모든 힘든 순간마저 남의 강요가 아닌 내가 택했던 것이기 때문인 것 같다.
가끔 너무 외롭거나, 또는 우울한 순간이 오면 어딘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하지만, 아래 글을 보니 나는 그저 그 우울감을 즐길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도 같다. 거창하게 어디론가 가지 않아도, 잠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트레일을 걷고 단순한 여행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새로운 주제를 찾아 또 다른 여행을 시도하는 저자의 모습에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됐다. 이 책은 트레킹을 꿈꾸는 사람은 물론 새로운 형식의 여행기를 찾는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이 글은 <작가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미디어, 마나마인>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Introducing DCLICK: An Incentivized Ad platform by Proof of Click. - Steem based AdSense.
Hello, Steemians. Let us introduce you a new Steem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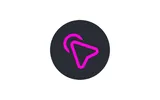
This posting was written via
dclick the Ads platform based on Steem Blockch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