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과 상상력에 의한 허구가 섞인 소설임을 밝힙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조교는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식탁에 팔 올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음식 흘리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의 불호령을 피할 수 없었다.
“103번 훈련병!”
나는 씹고 있던 음식을 급하게 삼키고 어색한 관등성명을 댔다.
“103번 훈련병 하정식!”
“조교 말 벌써 까먹었습니까?”
그의 말을 이해하는 건 금방이었다. 조금 전 움직이는 식판을 잡기 위해 왼손을 잠깐 올렸는데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었다.
조교는 한 동안 아무 말 없이 날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뱀 앞에 놓인 개구리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사회였다면 사과라도 했겠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사회의 통상적인 교양이 먹히는 곳이 아니었다. 조교의 시선이 거둬지고 나서야 난 겨우 밥을 다시 먹을 수 없었다.
식사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식사시간이 짧았으니까. 아마도 10분 정도였던 거 같다. 조교는 손목에 찬 시계를 한 번 보고는 말했다.
“식사시간 1분 남았습니다. 훈련병은 그동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 식판에는 아직 먹지 못한 밥이 많이 남아있었다. 나는 평소 밥 먹는 게 느렸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늘 뒤처졌다. 함께 고기라도 먹을 때면 몇 점 못 먹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주 내 몫을 따로 챙겨주시고는 했다.
밥을 다 먹은 동기들도 있었지만 나처럼 아직 먹지 못한 동기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조교는 개개인의 식사속도에는 관심 없었다. 아직 취사장 밖에는 식사를 못한 훈련병이 많았다. 그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조교의 제한시간이 떨어지자 아직 밥이 남은 동기들은 속도를 높였다. 밥을 몽땅 국에 말아 마시듯 먹거나, 입 안 가득 밥과 반찬을 쑤셔 넣고는 충분히 씹지도 않고 삼켰다.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는 몸부림은 처절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20대 초반의 나이었고, 소위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었다. 나도 숟가락을 서둘러 놀렸다.
최후의 1분이 지나자 조교는 가차 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다. 마지막까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입 속은 음식물로 가득했다. 더 넣었다간 오히려 뱉어낼 판이었다. 나는 결국 절반의 음식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서 조교는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식이면 안 남길 수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길게 마련된 수돗가에서 식판을 닦아야 했다. 수돗가 한편에는 식판을 닦을 수 있게 주방용 세제를 물에 풀어 대야에 담아놓았다. 그 속에는 수세미가 담겨있었는데, 죄다 손바닥 반만 한 크기였다. 수세미 하나를 반으로 잘라 놓은 거 같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걸레보다 더 헤지고 낡은 수세미였다. 이런 거지같은 수세미였지만 이마저도 넉넉지 않아 기다렸다 사용해야했다. 군대라는 집단은 정말이지 멀쩡한 게 하나 없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조교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빨리빨리 깨끗이 닦습니다.”
나도 그의 말대로 깨끗이 닦고 싶었다. 그러나 수세미는 엉망이었고, 세제를 풀어놓은 물은 묽디묽었다. 용빼는 재주가 있지 않는 한 식판을 깨끗이 닦는 건 무리였다. 열심히 수세미로 식판을 문대 봐야 기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조교는 수시로 우리를 채근했다. 손이 조금 느리다 싶으면 어김없이 훈번을 부르며 지적했다.
“빨리 안 닦습니까?!”, “뒷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입니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밥도 빨리빨리, 설거지도 빨리빨리. 신경쇠약에 걸릴 거 같았다.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분명 군대 때문에 생긴 게 분명했다.
“야! 존나 웃기지 않냐?”
옆에서 설거지하던 동기 윤립중이었다. 나보다 한 살 많았던 그는 내무실에서도 바로 옆자리였다. 그는 102번. 나는 103번.
“깨끗이 빨리 닦으라는 게 말이 되냐? 깨끗이 닦으려면 천천히 닦아야지. 안 그냐?”
그의 말이 맞다. ‘깨끗’과 ‘빨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군대에서 말이 되는 게 있던가. 나는 체념한 듯 대답했다.
“군대잖아.”
마법 같은 말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말. 제아무리 억울하고 이해가지 않아도 이 한 마디면 모든 게 납득이 됐다. 군대란 그런 곳이었다.
나는 식판에 묻은 잔반을 빠르게 처리하고 설거지를 끝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만져보면 여전히 기름기가 남아 미끈거렸다. 어차피 깨끗하게 닦는 건 불가능했다. 남은 건 빨리 뿐이었다. 내가 사용할 때도 누군가 이렇게 대충 닦아 놓았던 거라 생각하니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원효대사 해골물은 진리였다.
식판을 반납한 훈련병들은 취사장 앞으로 다시 모였다. 막사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손에는 훈련받는 6주 동안 사용해야 할 숟가락이 들려있었다. 먹기 위해서 무엇보다 잘 간수해야할 물건이었다.
립중이는 숟가락에 ‘세바스찬’이라는 이름도 붙여줬다. 당시 인기 있던 개그프로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을 따온 것이었다. 어딘가 별난 사람이었지만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 싫지는 않았다.

군바리의 식판 | #1 군바리는 식판으로 밥을 먹는다. (후편)
wirtten by @chocolate1st
| 이전 짬밥 |
#0 그들이 먹는 밥
#1 군바리는 식판으로 밥을 먹는다. (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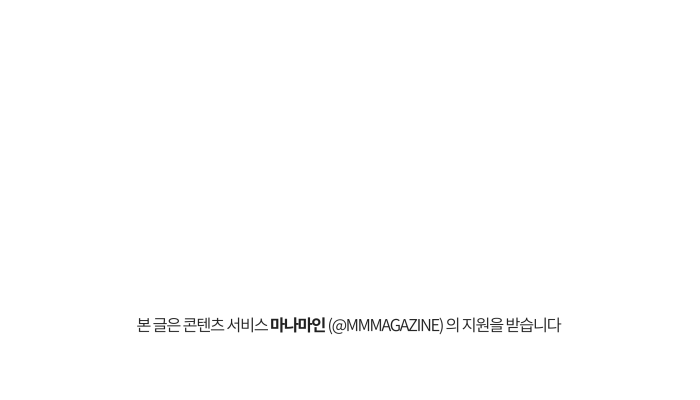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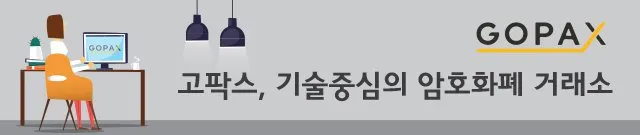
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남양유업 이제는 주주들에게까지 손을 쓰고 있나;;;;
내가 이러려고 국내기업에 투자했나 자괴감이 들어;;;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