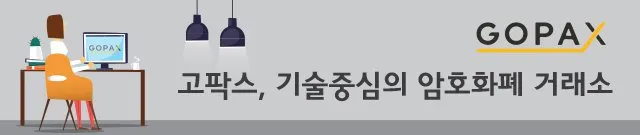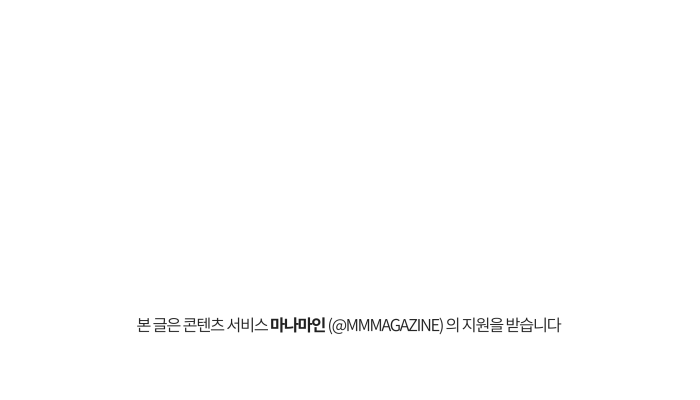*본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과 상상력에 의한 허구가 섞인 소설임을 밝힙니다.
내가 군에 입대를 한 건 2003년 7월의 어느 날이었다. 이제 막 피어나는 청춘의 사형선고와도 같은 입대 영장이 날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다니던 대학을 서둘러 휴학하고, 스쳐 지나가듯 친구들과의 송별회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논산훈련소 앞이었다. 내 나이 스물한 살이었다.
함께 온 가족들과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연병장 한편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자! 이제 입대 예정자는 가운데 연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연병장으로 향했다. 나는 그렇게 군인이 됐다.
입대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투복, 전투화 같은 보급품을 받는 것이었다. 한 번 받으면 군생활 내내 입어야 하는 것들이라 몸에 잘 맞는 걸 골라야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그렇게 개개인을 신경 써주는 집단이 아니었다.
오늘 나와 같이 입대한 사람만도 백 명이 넘는다. 시간은 없고 사람은 많다. 몸에 대충 맞는다 싶으면 골라 받아야 했다. 그래서 받은 전투복을 입고 나면 누군가는 바지가 터질 듯 작았고, 어떤 이는 너무 커서 당장에라도 흘러내릴 것 같아 손으로 꼭 쥐어야 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같이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 같았다. 사회에서는 모두들 평범한 청년들이었을 텐데. 군대라는 곳은 멀쩡한 사람도 어딘가 모자란 사람으로 만드는 묘한 곳이었다. 물론 나라고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보급품 배급이 끝나면 신체검사가 이뤄진다. 반바지 하나만 입혀 놓고 이런저런 형식적인 검사가 끝나고 나면 식사시간이 이어졌다. 군대에서 먹는 최초의 식사이자 훈련이기도 했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모자를 눌러쓴 조교는 취사장 앞에 우리를 이열종대로 세워 놓고는 소리 높였다.
“이제부터 본 조교가 식사에 대한 예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조교의 말을 잘 듣고 훈련병들은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큰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조교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시 물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네에!!”
조교는 먼저 우리에게 투박하게 생긴 숟가락을 하나씩 나눠줬다. 끝이 삼지창처럼 세 갈래로 갈라져있는 포크숟가락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됐는지 겉이 닳고 닳아 윤이 반딱반딱 나고 있었고, 이 빛나는 숟가락은 훈련소 내내 내가 사용해야 할 숟가락이었다. 조교는 지급받은 숟가락을 허벅지쯤 달린 건빵 주머니에 넣으라고 말했다. 숟가락을 그냥 주머니에 넣는다는 게 께름칙했지만 하는 수 없었다. 모두가 숟가락을 넣자 조교는 절대 숟가락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유야 뻔했다. 숟가락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조교는 우리 앞에 은색 철제 판때기를 들어 보였다. 세 개의 작은 홈과 두 개의 넓은 홈이 파인 식판이었다. 조교는 식판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다. 식판의 용도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결론은 다음 사람을 위해 잘 닦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조교는 식사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군대는 군대만의 식사법이 존재했다. 전우가 다 자리에 앉고,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후 먹을 것. 절대 숟가락을 든 손 외에 다른 손을 식탁 위로 올리지 말 것. 식사하는 팔의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할 것. 서로 대화하지 말고 빨리 먹을 것, 음식을 남기지 말 것 등등. 우리는 이런 긴 의식 같은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취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배식은 나와 똑같은 훈련병이 하고 있었다. 식판을 들고 음식 앞에 서면 배식을 맡은 훈련병이 내 식판에 음식을 떠 주었다. 음식을 받으면 옆으로 이동해서 다음 음식을 받고, 그렇게 수십의 훈련병은 차례대로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모든 음식을 배식받자 조교는 손짓으로 내가 앉아야 할 식탁을 가리켰다. 식탁은 열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이었고, 나는 앞선 조교의 설명대로 식탁에 모두가 앉을 때까지 잘 훈련받은 개처럼 기다렸다.
식탁의 자리가 모두 채워지자 조교는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외우라고 지시했다.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우리는 그의 말을 복창하며 식탁 가운데 적혀있는 문구를 큰 소리로 읽어 나갔다.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 음식을 준비해 주신 국가와 부모님, 전우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식사 시작.”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내 식판에 놓여 있는 건 짜장밥과 계란국, 오이무침, 김이었다. 메뉴가 짜장밥이긴 했지만 짜장은 밥의 절반 정도만 겨우 덮고 있었고, 딱 봐도 건더기는 보이지 않았다. 요령껏 잘 비벼도 절반은 맨밥으로 먹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김이 함께 나왔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짜장밥에 어울리지도 않는 김이 반찬으로 나온 게 설명되지 않았다.
국은 계란국인 줄 알았는데 옆 동기를 보니 북엇국이었다. 북어는 없고 계란만 떠있어 그런 줄 알았다. 잘 저어서 배식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배식하는 이들도 결국 나와 같은 훈련병이었다. 그들이라고 어디 가서 배식을 해봤겠는가. 양도 조절할 줄 몰랐고, 요령도 없었다. 짜장에 건더기가 없던 것도 아마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멀겋게 계란만 떠 있는 북엇국을 보고 있자니 내가 건더기 없이 국물만 먹었으니 나중 누군가는 국물 없이 건더기만 먹겠구나, 하는 부질없는 이타심이 들었다.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괴로울 테니까. (후편에 계속)

군바리의 식판 | #1 군바리는 식판으로 밥을 먹는다. (전편)
wirtten by @chocolate1st
| 이전 짬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