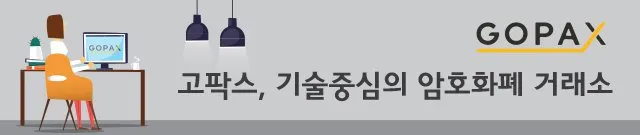현대 미술은 가끔 사람을 주눅 들게 한다. 유명하다는 데, 잘 그렸다는 데, 값이 비싸다는 데……. 도대체 나는 왜 유명한 지, 왜 잘 그렸는지, 무얼 표현하고자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학교 다니면서 본 그림 가운데는 밀레의 만종을 좋아했다. 삶이 묻어있어, 눈 감아도 그 그림이 떠오른다. 피카소 그림은 좀 특이한 그림이구나 싶은 정도였다. 그 외도 많고 많은 그림을 보았지만 느낌이 쉽게 오지는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추상화된 그림을 볼 때면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왜 남이 그린 그림을 보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한단 말인가. 감동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다. 화가들의 삶을 이해할수록 불행한 화가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는 감동을 위하여, 남이 해설해 놓은 그림 평을 억지로 읽노라면 자신이 더 슬퍼진다. 독창성, 예술성, 전위성…….그림이 추상화할수록 해설도 추상화되어 어렵다. 그림을 보기도 전에 남들이 해 놓은 작품 평을 먼저 보고 가야하다니... 내 느낌은 제쳐두고, 남 느낌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슬픈 현실.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눅 들게 하는 모순.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흘렀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온 것에 감사하면 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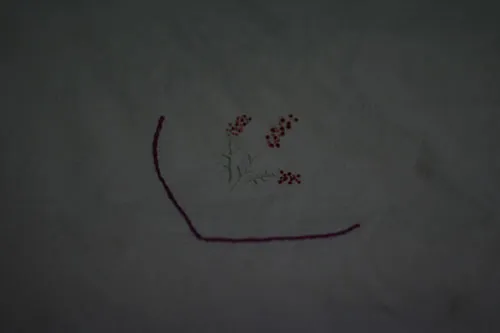
며칠 전, 아내가 꺼낸, 작은 요를 보게 되었다. 얼룩얼룩 홑청에다가 수를 놓았다. 아, 그런데 어떤 느낌이 온다. 삶의 향기라고 할까.
“이거야말로 예술이네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아기 때부터 싼 오줌이 얼룩으로 벤 거니 오래도록 썼네요.”
아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 많은 사연이 있다. 장모님이 딸 결혼 시킨다고 귀한 목화솜을 구해다가 이불을 해주고 남는 솜으로 만든 거란다. 자투리 솜이지만 행여나 쓸모가 있지 싶어 보관했다가 손녀가 태어나자, 요를 해 주신 거란다.
어렵기만 하던 현대미술에 대해 투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화가의 삶을 이해하면 그 나름대로 감동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이 요는 적어도 내게는 두고 볼만한 예술작품이라고 자뻑을 해본다. 한두 달 만에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작품(?). 사람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예술. 아이 성장과 아내의 땀방울 그리고 햇살과 바람 그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삶의 예술이다.
자수는 그 위에서 자란 딸이 자신의 성장을 기념하면서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