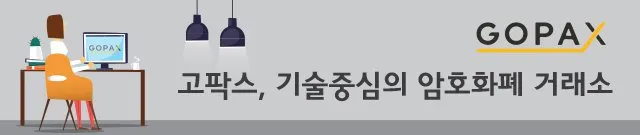한자로 마을은 동(洞)이다. 이 글자를 뜯어보면 재미난다.
물 수(水) 변에 같을 동(同)이다. 그러니까 물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룬다.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물이 아주 중요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닌가. 마실 물은 물론 농사짓는 물 역시 아주 큰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들이 물을 끼고 발달한다. 작은 내는 작은 마을을, 큰 강은 큰 마을을 이룬다. 서울이 지금처럼 크게 발달한 데는 한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기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물은 젖줄, 생명줄이다.
그런데 도시화와 광역상수도가 발달하면서 마을이 갖는 뜻이 달라진다. 지금은 그저 행정단위일 뿐. 대부분 마을들은 물과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여전히 마을 동이다. 마을이 새로 생긴 지 20년 남짓. 젊은 마을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마실 물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한다. 여기에 따라 다양한 울력이 있다. 물탱크를 청소한다든가, 풀베기 같은 일을 함께 한다. 이렇게 일이 딱 정해진 것들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뜻밖에 일이 생길 때다, 오늘 마을 회관에 상수도가 고장이란다. 반장이 부랴부랴 주민들을 불렀다. 대략 절반 정도 모였다. 주말인데도 이 정도 모인 건 상당한 친화력이라고 봐야할 거 같다.
우리는 딱히 문서화된 마을 규약이 없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양하다보니 어떤 규칙으로 주민을 얽어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벌금을 중요시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면 양해를 구한다. 이 때 벌금이라기보다는 마을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기꺼이 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흐름들에 답답해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제법 혁신적인 부분도 된다.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규약인 셈이고, 나쁘게 보자면 이를 악용한다고 여기게 된다.
아무래도 마을을 더 많이 아끼는 사람들이 마을 일도 더 많이 하게 마련이다. 물을 같이 씀으로써 이 참에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본다.
이러한 우리 마을이 앞으로 어찌 굴러갈지 나 자신도 궁금하다. 우리 마을은 딱 정해진 규약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늘 돌아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