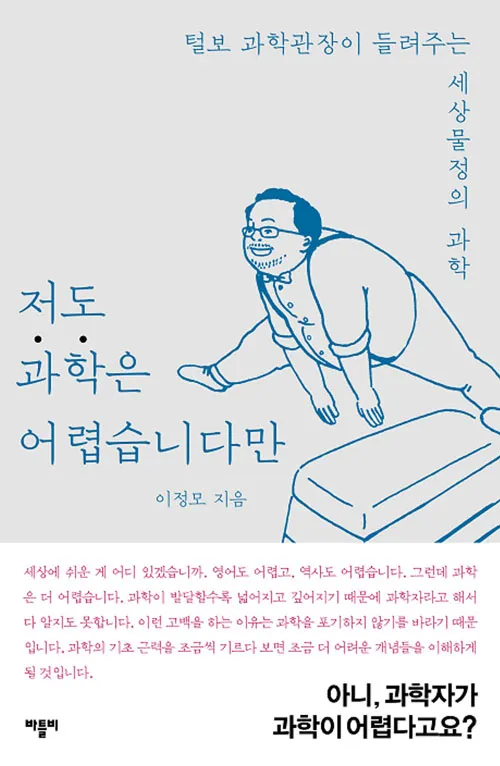
책의 제목과 서울시립과학관장인 저자를 보고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책이 또 하나 나왔을 것이라고. 하지만 읽다보면 처음부터 약간 당혹스러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과학책이 아닌 것 같은데?'
글은 초반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알기 쉽고 간단하게 말이죠. 근데, 중반부터 이런 자연 현상은 인간과 세상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식물은 물을 최대한 증발시킨다. 하지만 태양을 이길 수는 없는 법. 결국 이파리가 노랗게 죽고 만다. 큰 나무들도 가지를 축 늘어뜨린다. 한여름에 자라는 곡식이라고는 물 위에서 자라는 벼를 비롯해서 몇 가지 안 된다. 그렇다. 뜨거운 여름에는 식물도 쉬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식물이 이럴진대 사람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중략) 2017년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들이 보장받은 유급휴가는 1년에 평균 14.2일에 불과했다. 전 세계 평균 24일에 한참 못 미친다. (중략)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p. 28
느낌이 좀 왔나요? 이 책은 사회학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다만 과학의 소재를 근거로 가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저는 초반에 이런 내용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서평을 보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독자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과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해야지, 거기에 자기 주관을 넣어서 특정 메세지를 꼭 전달해야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거부감이 주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과학자에게는 자유로운 과학 연구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적극 나설 의무가 있습니다. (…) 과학자는 (…) 어렵게 얻은 정치적, 경제적 신념을 똑똑히 밝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에이브러햄 링컨 탄생 130주년에 한 말이다. - p. 171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난 정치나 사회는 잘 몰라요."
사람마다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겠지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생각은 논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논리적인 시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입니다.
책의 서문을 되돌아 읽어봅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은 단순히 지식의 집합이 아니다. 과학은 생각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존경하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과학은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같은 말이다.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과학책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