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레 치명적인 불치병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정하기 싫은 물음이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가정하기 싫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벌어질 예상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그려보지 않는다. 혹시 당신이 "만약 내게 충분한 돈이 있으며 또 이만큼 발달된 문명의 의료 시스템이라면 병원 측에서 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제안하지 않겠는가?"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정작 그날이 닥쳤을 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방식으로 죽어갈 확률이 높다. 현직 의사인 아툴 가완디의 저작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렇다.
현 의료 시스템은 진찰실에 앉아있는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리쳐야 할 병'으로만 바라본다.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는 1도 관심 없다는 점에서 의사는 마치 악령이 빙의된 몸을 대하는 퇴마사의 태도와 같다. 네 이노오오옴! 썩 물러가지 못할까!? 성수를 뿌려주마! 어어어? 이래도 안 나가? 그렇다면 부적을 받아라! 오옷? 이것도 말을 안 듣다니, 그렇다면...! 라는 식이다. 지금 시대의 의사는 병을 다루는 사람일 뿐이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현 의료 시스템에게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송두리째 베팅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화학 치료에 화학 치료를 거듭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여유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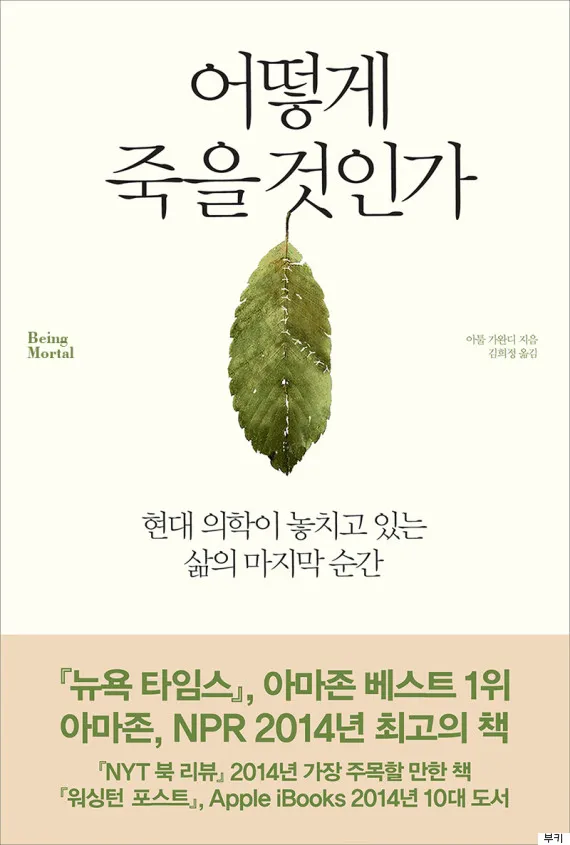
그런데 문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한 이 사회 전체가 환자를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몸으로 병세와 싸우고 있는 환자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해줬을까? 혹시 무조건적인 안전과 생존을 이유로 폭력적인 생활방식을 환자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만약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면 그때부터 환자는 주위의 훈수 쓰나미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 먹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등의 '마라' 조항은 끝없이 늘기 마련이고, 몸에 좋다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등의 '해라' 조항도 한없이 추가된다. 환자는 가족의 뜨거운 사랑과 의사의 차가운 진료 덕분에 점점 침울해진다. 누구도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 절대로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삶은 생존기계에 불과하다.
5년 전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 마비와 언어 장애가 찾아왔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지만, 그 당시는 의사조차 미래를 낙관하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환자복을 입은 엄마와 함께 병실에서 잠드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잠 못 드는 새벽에 엄마가 내게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왔다. "컵라면 먹으까?" 의외였다. 평소 엄마는 컵라면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안돼! 엄마 지금 식단 조절하고 있는 와중인데 몸에 안 좋은 컵라면이 웬 말이여?"라고 말을 해야 되나 1초 정도 고민하다가, "컵라면?? 그르까?" 라고 대답하고는 몰래 편의점에서 컵라면 두 개를 사 왔다. 불 꺼진 컴컴한 병실에서 그날 엄마는 컵라면을 후루룩짭짭 정말 맛있게 잡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태어나서 엄마에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효자 짓이었다. 컵라면이 졸라 땡길 때 컵라면을 먹을 수 없다면,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thelump
257
말기 환자 500여 명의 주치의들에게 자신의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다음 환자들의 병세를 추적했다. 그 결과 63%의 의사들이 환자의 생존 기간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530% 과대평가되어 있었다. 의사가 환자를 더 잘 알수록 오차 범위가 커졌다.266
이것이 바로 수백만 번 반복되는 현대의 비극이다. 우리가 풀 수 있는 생명의 실타래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길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실제보다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상상한다면 우리는 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혈관에 화학약품을 투여하고, 목구멍에 관을 삽입하고, 살에 수술로 꿰멘 자국을 가진 채 죽어 가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더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사들이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북스팀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