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ost is the eighth part of my serial anti-romance reminiscences.

<커피 혼자 마시고 싶으니 나가주세요.>
오늘은 뭔가 단절된 생각들을 나열하려 하지만, 왠지 전체적으로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에 맞는 내용 같다.
멀리 떠나와서인지 요즘은 별로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은 왜 내게 이럴까' 류의 질문을 받는 일이 꽤 자주 있었다. 물론 '그 사람'이란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인물.
뭐 복잡하게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이 너에게 그러는 이유'는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이다. 그냥 매우 자명한 얘기다. 뭐든 간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니까 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걸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럴 방법이 단 하나도 없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 사실 그 행동을 당하는 사람에게로 공은 이미 넘어와 있다. 그런데 못하게끔 하는, 바로 그걸 못하는 거다.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아예 만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든.
오늘 갑자기 엄마가 오셨다. 도착 몇 시간 전에 얘기하긴 했지만, 당일 방문은 참 곤란하다고. 그냥 대충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엄마들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가 들어있는 냉장고하며...나는 이렇게 공간에의 침범을 당하면, 어질어질하다. 모든 힘이 쭉 빠져나간다고 해야되나. 원할 때 초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니 말이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휘청거리는 중이다. 아마도 오늘 글에서 뭔가 감지될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는 적당히 조용한 노래를 하나 골라서 계속 듣는다. 노래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 잠깐의 침입에 내 생활이 깨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봐, 계속 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어. 아무런 파장 없이 시간은 지속되고 있어.
Wet, wet, wet의 Angel eyes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난 내 공간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것 자체를 참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 시리즈의 6회차의 마지막에서 언급한 이래로 아직 제대로 등장시키지 않은, 등에 반해서 오래 만나게 된 그 사람도 그런 경우였다.
처음 만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굳이 털어놓을 법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첫 만남에서 '나는 반드시 공간을 홀로 써야 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금방 알아채지는 못했다. 뭔가 나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만 들었을 뿐.
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느낀 계기는 '선물'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줄 만한 귀걸이 류에서, 갑자기 큼지막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바뀌기 시작했다. 스피커 바꿔준다, 거실에 깔으라고 러그를 보낸다, 그냥 생각나서 가구 하나 샀다, 모니터는 보냈는데 본체는 괜찮냐, 등등.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일단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쉽게 사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가 되겠지만, 그건 사실상 무언의 공간 장악이었다. 이유 모를 분노를 살살 지피우는 침입의 시도.
물론 그땐 나도 변해 있었다. 정확히는 변했다기보다, 자라났다고 봐야겠지. 그 사람과 꽤 오래 만난 시점의 나는 선물이 비싸다거나 유용하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물론, 처음 만난 누군가가 나처럼 공간을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지 정도는 알아챌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는 나와 같은 부류였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한 공간을 나와 공유해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점점 부피가 커지는 선물은 그걸 빨리 알아채게 해주는 계기일 뿐이었다. 5회차에서 묘사한 적이 있는, 그를 오딧세우스처럼 생각하던 내 편안함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오딧세우스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왕이 귀환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귀찮은 떨거지들도 없애주고 좋을 것 같지만, 앞날을 매일같이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이다. 페넬로페는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내 경우엔 방랑 중인 오딧세우스가 좋았던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다.
그리고 점점 내게 '약점'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그간 만나면서도 자연히 알게 된, 객관적인 약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털어놓기 시작한 것들은 정말로 알고 싶지 않은 류의 약점들이었다. 그 자체로 크지도, 심하지도 않지만 (게다가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털어놓아야 알 수 있는 류의 약점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너무나도 쉽게 헤어짐을 결심할 수 있었다. 그 약점들 때문에? 절대 아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내가 점점 뒤로 물러서기 시작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약점들을 내게 털어놓게 된 것 자체 때문이었다.
크게 말하면, 전에도 표현했듯이 '내게 의존하기 시작'해서라는 것이 이유일 것이다. 그는 민망하다거나 '척 하는 것' 등의 감정을 점점 내려놓고, 속에 있는 것들을 내게 서서히 털어놓으면서 안정감을 얻게 된 것이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따위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자신을 열기 시작했고, 나는 패닉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중요한 포인트는 공간이나 약점이 아니라, '길들임'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길들여지길 싫어한다는 점에서 나와 비슷한 그를 오래 만났고, 그 기간 동안 그는 길들여짐에 대해 뭔가 순순한 감정을 갖게 된 반면, 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마치 성서 속에서 둘이 추수를 하다가(또는 그 무엇을 하다가) 한 명만 하늘로 불려 올라간 것처럼, 나만 원래대로 남겨졌다. 물론 그 관계에서 떠난 것은 나였으니, 말이 그렇다는...
길들임을 거론하니, 어린 왕자의 여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나는 여우가 말도 안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어린 왕자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길들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함정에 빠지다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뜻과는 좀 다르지만, 일종의 언행불일치다. 길들인 상대방에게 책임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맞는 얘기지만, 그걸 알면서 쉽사리 길들여지고 싶을 리가 없다. 아니면 여우가 직접 말한대로, 금빛 밀밭(이었나?)을 볼 때마다 왕자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물론 로맨틱들(로맨틱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 길들임이라 불리는 것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말이 길들임이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가.
안티로맨틱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무엇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도 누군가에 대해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딱 그 충동적인 짧은 기간 동안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하마터면 일생의 실수가 될 뻔했다는 느낌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황금빛 밀밭(또는 그 무엇)을 볼 때 떠올릴만한' 기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멍해서 아무도 안 떠오른다.
말하는 것만 보면, 여우는 왕자의 장미와의 관계를 조명해주기 위해 넣은 편리한 '현자' 캐릭터 같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울려고 한다. 아는 것에는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다 알면서도 길들여지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
글쎄, 내 생각에 길들여지고 싶은 것에는, 그저 길들여지고 싶다는 것 외의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게 그렇게까지 쟁취하고 싶은 것일까. 오늘도 한 번 갸우뚱하게 된다.

지난 회차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 1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 2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 3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 4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 5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 6
어느 안티로맨틱의 수기 7
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데이빗 이야기 #2] 만든 사람은 있지만, 손대는 사람은 없는 완전 자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DAYBIT) 사용후기
안녕하세요, 디온(@donekim)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데이빗 거래소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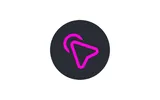
이 글은 스팀 기반 광고 플랫폼
dclick 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